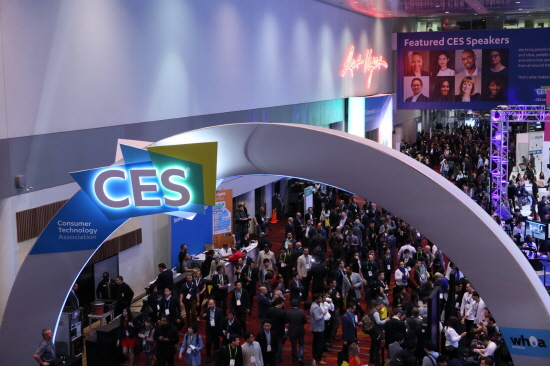
CES2018은 참가업체 중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 중국 업체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방대한 내수시장을 근간으로 빠르게 힘을 키우고 있다. 다만 전시회에서 시선을 끌기엔 아직 부족하다. 일반(B2C) 관객은 미래를 보기 위해 전시회를 찾는다. 이들에게 중국 업체 전시관은 어디서 본 듯한 제품의 나열이다. 신기함을 보여주는 곳도 아니다. 이곳 말고 갈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중국 업체 전시관은 주로 기업(B2B) 관객이 찾는 이유다. 해당 업체가 어떤 제품을 어떻게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살펴야 격차를 벌리거나 따라잡을 수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중국 업체를 활용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하이얼은 인공지능(AI) 플랫폼 ‘유플러스(U+)’를 내세웠다. 스마트홈 허브다. 냉장고에 터치스크린을 부착해 정보를 공유하는 ‘링크 쿡’을 발표했다. 카메라를 탑재 냉장고를 열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식재료를 파악해 모자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원산지 추적과 유통기한 관리 기능도 있다. 또 인치별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TV를 선보였다. 제2의 삼성전자와 다름없다. 유플러스는 ‘빅스비’ 링크 쿡은 ‘패밀리허브’다. QLED TV는 삼성전자의 대표 프리미엄TV다.



중국 업체 중 전시 그 자체로 인기를 모은 곳은 하이센스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후원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축구로 시선을 모은 뒤 관람객 동선을 자연스럽게 초고화질(UHD) 8K TV로 유도했다. 8K TV는 CES2018을 통해 시장 진입을 타진한 대표 품목. 삼성전자 소니 등이 8K TV를 공개했다.

한편 한국 중국 일본 기술 수준은 이미 종이 한 창 차이다. 브랜드 가치와 시장별 접근법이 3국 업체의 경쟁력이다. 일본의 위기는 해외보다 내수에 집중하며 시작했다. 한국의 도약은 해외에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 사이 어딘가에 있다. 앞으로도 중국이 한국 일본을 역전할 수 있을지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견제를 버텨낼 수 있을지 끝없는 경쟁은 이어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